
하지만 이 나라의 자랑거리는 그런 것들만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적 의회인 ‘알싱(Althing)’과 1955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 할도르 락스네스(Halldor Laxness, 1902~1998)도 아이슬란드 사람들 자부심의 원천이다.
알싱은 930년 처음 소집됐다. 한 농부가 무고한 자기 노예를 참살하자 종족 지도자들이 그 농장의 들판에 모여서 어떻게 처벌하고, 재발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논의했다. 이후 이 들판에서는 매년 날씨 좋은 6월이면 정의 실천과 법률 제정을 위한 알싱이 열렸다.(‘thing’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의체’라는 뜻의 북게르만어다.)
영국 저술가 제이콥 브르노우스키(1908~1974)는 자기 책 ‘인간 등정의 발자취’ 마지막 장에 알싱에 대해 짧지만 강렬한 글을 남겼다. 그는 인간 이성과 과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많은 저작을 남긴 사람이다. “930년이면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이다. 중국에서는 황제의, 유럽에서는 어린 왕과 귀족들의 착취가 판을 치던 때다. 노예 소유 문화권에서 정의가 그렇게 공평하게 구현된 것은 무척 희귀한 일이다. 놀랄 만한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상반된 두 개의 명제 사이를 줄타기하듯 살아간다. 바로 이 점이 인간의 생물학적인 특성이다.” 알싱은 19세기 후반 들판에서 레이캬비크의 의사당 안으로 들어갔다. 물론 지금은 종족 지도자 대신 투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알싱을 이끌어간다.
락스네스의 소설 중 가장 주목을 받은 작품은 노벨상 수상 이후인 1968년 작 ‘빙하 아래(Under the Glacier)’다. 미국의 탁월한 지식인이자 예리한 평론가였던 수전 손택(1933~2004)은 이 소설을 “소설의 모든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딱 하나뿐인 소설이며, 최고 경지의 조소와 자유와 기지를 담은 작품”이라고 극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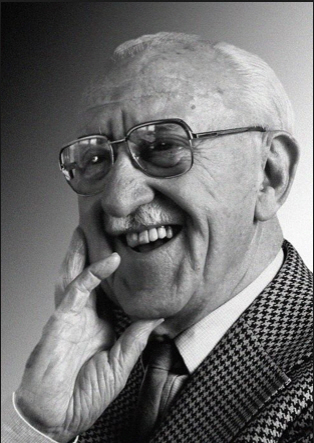
이런 설정으로 전개되는 ‘빙하 아래’에 대해 손택은 “공상과학소설, 우화, 철학소설, 몽환소설, 통찰적 소설, 환상문학, 지혜문학, 패러디, 포르노 등 소설의 모든 범주가 다 들어 있는 유일한 소설, 지극히 독창적이고, 가장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극찬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자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 소설을 손택은 “비슷한 주제를 무겁고 우울하게 다룬 독일과 러시아의 작가들과 달리 락스네스는 밝고 명랑하게 질문하고 답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말로도 평했다.
불행히도 이 소설은 우리말 번역이 없다. 손택의 평론집에 소개된 요약을 읽었을 뿐인데도 놀라웠고 즐거웠다. 락스네스의 뛰어난 상상력을 즐길 수 있었다. 최고로 무거운 이야기를 정말 독창적이고 재미있게 다뤘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족(蛇足) : 월드컵에서 주목을 제대로 받는 나라가 되려면 최소한 제대로 된 의회는 있어야 하나?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도?











![[컬처콕 플러스] '아파트' 대박난 로제, 제니·로사와 다른 점은?](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956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