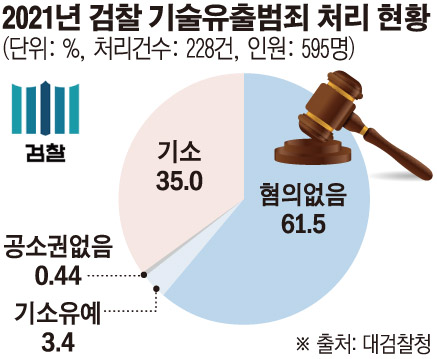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기술 유출 범죄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피해 사실 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 어렵게 법률 절차를 밟아도 솜방망이 처벌로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을 탈취한 기업이 하청을 주는 대기업인 경우 정보의 편재로 인해 피해 사실 입증조차 쉽지 않다.
A기업 같은 상황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실시한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 조사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기술 유출과 탈취가 발생한 이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들 중 38.9%는 ‘법률 비용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법률 비용에는 단순 소송 비용뿐 아니라 기업의 시간적 비용도 포함된다. 대기업의 경우 전문 법무팀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표가 직접 법적 절차를 신경 써야 하다 보니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 또 기술 유출 대상이 주요 거래처라면 법적 절차 이후 일감이 끊길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올해 2월부터 수탁 기업이 기술 유출·탈취 시 과태료 부과와 손해액의 3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됐지만,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한다. A기업 관계자는 “피해를 당해도 차라리 소송을 안 하는 게 속 편하다는 업계의 이야기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과거 피해 기업의 생산능력 범위에서만 이뤄지던 산정 범위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손해를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상생협력법은 피해 배상 산정 기준에 대해 기술 자료의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료’로 규정했다. 문제는 합리적인 사용료라는 개념이 모호해 여전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술의 시장 가격을 알기 어려운 벤처 기업은 합리적 사용료라는 개념 아래, 피해 금액을 입증하기 어렵다. 결국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손해 배상을 평가하게 되고, 기존 판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미국은 현재 기술의 시장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존의 시장 가격보다는 높게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용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아래 많은 유관 기관이 있는데, 유출 피해를 당한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3배수 징벌적 손해배상’도 여전히 피해 기업을 구제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박 변호사는 “최대 3배수로 규정돼 있으면 재판관이 실제 판결에서 최대 3배 배상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낀다”면서 “‘최소 3배수’ 등으로 실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상 방안 중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두는 과징금 일부를 피해 기업에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술 유용 기업이 처벌을 받아도, 피해 기업은 보상을 위해서 수년이 걸리는 민사소송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과징금 일부를 피해 기업에 주는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 기금법’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요즘 가요계선 '역주행'이 대세?…윤수일 '아파트'→키오프 '이글루'까지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92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