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국가 과학기관인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는 전 세계에 총 53개 연구기관에서 5700명 이상이 연구자들이 에너지, 광업, 농업, 데이터, 제조업 등 국가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있다.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와이파이는 국가의 우선순위를 우선시하는 CSIRO의 원칙 속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각) 멜버른 교외 지역인 클레이튼에서 만난 폴 세비지(Paul Savage) CSIRO 제조사업부의 과학 부책임자는 호주에서 기초과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블록펀딩과 실패해도 용인하는 R&D 문화를 꼽았다.
그는 “과학기술에서 짧은 기간에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많은 투자자가 1~2년 후 투자받으려고 하는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짧은 기간에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며 “5~1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기다려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같이 성적이 낮은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제도가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며 “우리는 호주 정부가 4년 예산을 통째로 주고 신뢰하며 개별 프로젝트에 개입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블록펀딩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관여하거나 통제하지 않지만 CSIRO 대표가 정기적으로 과학 장관에게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평가를 받는 등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비지 부책임자는 “우리도 R&D 업 앤 다운을 경험했다. 중요한 것은 연구가 국가의 우선순위와 관련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어떤 연구자들은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연구 주제를 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정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연구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35년 전에 CSIRO에 왔을 때 양모산업이 제조사업부의 사업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연구를 하지 않는다. 반면 당시 양자나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은 큰 부분을 담당한다”며 ”우리 같은 연구기관은 새로 떠오르는 국가 우선순위나 경제의 중요한 게 뭔지 잘 면밀히 관찰하면서 재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호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고문인 수석과학자(Chief Scientist)가 있다. 수석과학자는 산업계 및 연구계로부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달 23일 서호주 정부에서 만난 피터 클링켄(Peter Klinken) 수석과학자는 “제 역할은 정부 관계자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치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의 43개 대학 중 9곳(멜버른대학교, 시드니대학교,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 모내시대학교, 퀸즐랜드대학교, 서호주대학교, 아들레이드대학교, 시드니공과대학교(UTS))은 세계 대학 순위(QS) 100위에 포함된다. 호주 정부의 전폭적인 R&D 지원과 각 대학이 운영하는 산학연계프로그램, 학생 주도적인 연구환경 등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호주에서 세계적인 대학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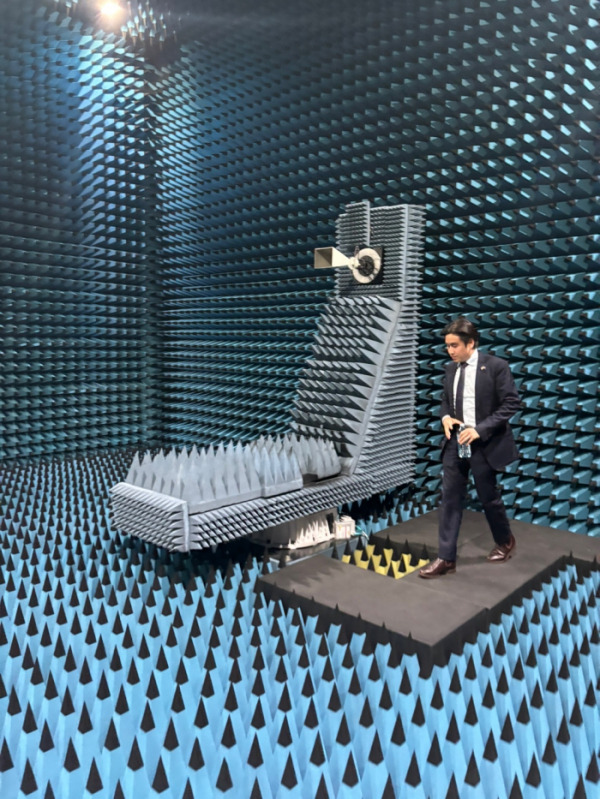
지난달 16일 UTS 테크랩에서 만난 아이반 추아(Ivan Chua) 매니저는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의 문제는 지식을 특허 등록을 해서 보호만 하고 산업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며 “1이 기초연구고 9가 상품화라고 비유하면 많은 대학이 1~3 수준에 머물고 기업들은 8~9단계에서 일할 뿐 협력이 없었다. 제가 양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아 매니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이 기술을 라이센싱해서 기업에 팔거나 연구자들이 창업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돈과 시간이 많이 들고 연구자들이 위험성이 높은 창업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대학과 산업계와 명확한 목표를 잡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UTS는 6500만 호주 달러(약 589억 원)를 투자해 산학협력 프로젝트 환경을 조성했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각) 빅토리아 정부의 기금을 받아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모내시대학교 스마트 제조 허브를 방문했다. 아드리안 닐드(Adrian Neild) 기계항공공학과 교수는 “대학생과 기업을 연계하는 3가지 산업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 하나가 박사과정 학생들이 3.5년간 산업계에 근무하는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이 본인의 연구 성과로 평가받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기업에 어떤 이바지를 했는지를 평가한다는 점이 다른 대학과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모내시대학교에는 학생들이 공부한 학문이 연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꿈을 펼쳐볼 수 있는 ‘메이커스스페이스’가 있었다. 이곳에서는 현재 1000여 명의 학생이 19개 팀을 꾸려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개발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닐드 교수는 “화성 환경에 적합한 탐사로버를 만드는 팀부터 호주에서 가장 빠른 자전거를 만드는 팀, 무인비행기팀 등이 활동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실제 기업 환경처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팀워크나 리더십 스킬 등 기업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23년 호주 연방예산안에 따르면 R&D 예산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21억 달러다. 예산은 R&D 연구개발세수(26.1%), 고등 교육 부문의 연구 블록 보조금(16.8%), CSIRO(8.3%) 등으로 구성됐다.
국내에서는 2025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연구기관,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부설 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호주 워클리재단이 공동 주최한 ‘2024년 한-호주 언론교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보도되었습니다.











![요즘 가요계선 '역주행'이 대세?…윤수일 '아파트'→키오프 '이글루'까지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92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