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 개념으로 자금조달 도와야”…박영민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단장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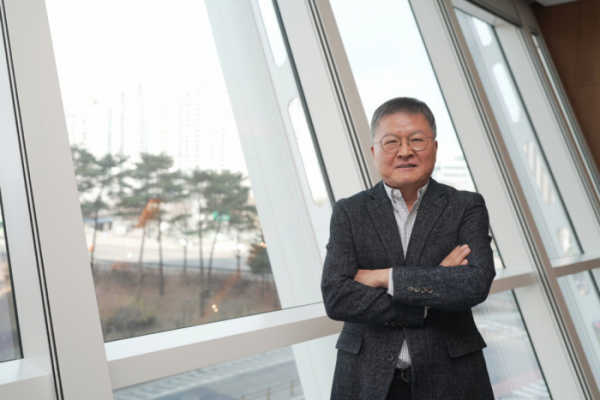
“시간, 협력, 돈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기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박영민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단장의 답이다. 신약개발은 10년 이상 장기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 박 단장은 “기업·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민·관 투자를 지속해야 ‘국산 블록버스터’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최근 박영민 단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산 신약의 블록버스터 가능성에 대해 들었다. 의사이자 과학자로 KDDF를 이끄는 박 단장은 제약·바이오 전문가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약학단장,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원장, 대한면역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매출 1조 원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2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과를 거둘 잠재력을 가진 국산 신약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항암제 레이저티닙,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테고프라잔과 펙수프라잔염산염 등 국산 신약들이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며 “진출 국가가 점차 늘어나면, 이들 중 최소 2개는 블록버스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속해서 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국산 신약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갈길이 멀다는 것이 박 단장의 견해다.
박 단장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율은 세계 2위, 금액은 5위로 추산된다. 민간 투자도 활성화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바이오 인력도 꾸준히 증가해 주요 선진국 대비 한국의 기술 수준은 77.9%, 기술 격차는 3.1년으로 좁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내 신약 R&D 투자는 상위 기업 10곳을 합산해도 약 2조1000억 원”이라며 “글로벌 빅파마로 꼽히는 기업들은 한 해에만 17조~19조 원을 R&D에 투자한다”고 비교했다.
또 국내 기업의 경우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상업화까지 완주하는 사례가 드물다. 기술수출로 마일스톤을 확보하는 성과는 흔하지만, 자체적으로 개발을 완료해 출시에 이르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단장은 “국내 기업들은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임상 3상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실패해 개발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국내외 규제기관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는 절차도 까다로워, 오랜 기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과정에서 경영 환경 변화나 자금난에 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단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는 개발·상업화 전략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그는 “R&D 자금을 조달하면서 해외 규제 장벽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으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단장은 “경쟁력 있는 특정 질환이나 기술에 집중해 전략적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항체약물접합체(ADC), 메신저리보핵산(mRNA) 등 새로운 모달리티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로, 미충족 수요를 해소해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대학, 연구소, 스타트업 등 외부의 혁신 기술을 적극 수용해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에 익숙해져야 한다”라며 “다국적 제약사와 공동 연구, 라이선스 계약, 공동 임상시험 등을 통해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피력했다.
박 단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업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낮은 약가가 국내에서 신약을 출시하는 데 허들이 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약가 책정 시 기존 출시된 국가의 약가도 판단 기준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박 단장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임상 2~3상은 단순히 연구비 지원 개념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도와야 한다”라며 “정부에서 이미 제약·바이오 펀드를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치대학] 美 대선, 막판까지 초박빙…당선자별 韓 영향은?](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81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