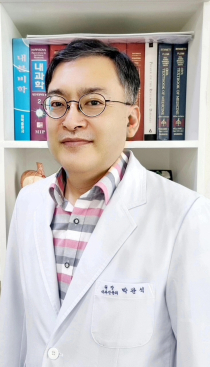
그러나 축제의 이면에 도사리는 위험, 바로 부상이다. 흥겹고 빠른 템포의 축제를 즐기다 보면 미끄러지고 넘어져, 이곳저곳에 멍이 들고 피부가 찢기고, 드물게 골절이 생겨 응급실을 찾게 된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방인들이지만, 진료하다 보면 공통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다. 지갑을 만지작거리거나 쭈뼛거리며 병원비를 물어보는 일이다.
상처의 크고 작음, 휴가를 끝내야 하는 아쉬움보다 더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병원비에 대한 걱정, 하지만 원무과를 거쳐 병원문을 나서는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원더풀 코리아”를 연발한다.
저렴한 병원비, 빠른 검사와 정확한 치료 때문이다. 유럽에서 온 푸른 눈을 가진 젊은이가 치료 중 농담을 던진다. 통역을 통해 알아보니 자기 나라에선 검사와 치료를 하려면 벌써 상처가 아물었거나 덧나버리기 일쑤고, 혹시 CT나 정밀검사라도 받으려면 무덤 속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켜야 한단다. 물론 과장된 조크겠지만, 외국 여행 중 아프거나 다쳐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한국 의료상황이 더 걱정이다. 원더풀 코리아의 명예를 얻었던 자랑스럽던 K-의료가 심한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잘 이겨낸다면 건강을 되찾고 더 단단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긴 시간 동안 계속된다면 후유증도 심하고, 회복이 힘들기 마련이다. 현장의 의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기에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큰 후유증이 남기 전에 잘 봉합되고 아물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박관석 보령신제일병원장











![요즘 가요계선 '역주행'이 대세?…윤수일 '아파트'→키오프 '이글루'까지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92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