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려한 영상미가 돋보이는 ‘봄’은 영화 ‘장화, 홍련’, ‘후궁 : 제왕의 첩’ 등의 미술 감독이자 영화 ‘26년’을 연출한 조근현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예술성을 인정받아 산타바바라, 달라스, 마드리드, 도쿄를 비롯한 밀라노국제영화제 등 해외영화제에서 8관왕을 휩쓸었다. 이유영은 밀라노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신예가 데뷔작에서 해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커다란 영광을 안은 것이다. 만남도 운명처럼 꽤 강렬했다.
“시나리오를 보고 소속사 대표님한테 ‘저 이거 너무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그걸 하겠다고?’라며 절 말렸어요. 누드모델이란 것만으로도 ‘미쳤다’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전 무조건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주위에서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두고 봐’란 마음을 품게 됐고요. 빨리 조근현 감독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유영은 조근현 감독과 첫 만남에 대해 “똑바로 절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힐끗하며 눈을 제대로 안 쳐다보시더라. 마음에 드는 건지 안 드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는 순간 제 눈이 마음에 들었고, 민경이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유영은 기회를 잡기 위한 남다른 의욕도 품었다. 그녀는 “하루는 청순해보이고 순수해보이게 깨끗한 단색 원피스를 입고 가고, 하루는 아이 엄마로서 상처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게끔 노력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이유영은 “개인적으로 힘들 일이 생긴 날 감독님을 만나게 됐는데 오히려 ‘더욱 민경 캐릭터 같다’는 반응을 얻게 됐다”고 에피소드를 덧붙였다.

억척스러운 삶 속에서 피어난 민경은 누드모델 제의를 이내 받아들이는 한편 남편의 폭력도 감당한다. 그 순응하는 태도의 바탕에는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평범한 삶에 의지가 깔려있다. 이를 연기한 이유영은 촬영 돌입 후 감독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졌다.
“독기요? 제 깊숙한 내면이나 무의식에는 욕심이나 독한 면모도 있으니 하게 된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봄’을 찍을 땐 제가 크게 욕심을 내거나 독한 마음을 품거나 할 필요가 없었지요. 노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조근현 감독은 리허설이나 연기 연습에 열을 올리지 않았다. 이유영은 “감독님은 늘 간단하게 얘기하셨고, 힘 빼고 연기하길 원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는 호평 속에 예술성을 갖춘 작품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말릴 때도 이해가 안 갔어요. 스물다섯(만 스물넷)이었잖아요. 사람들 말로는 제일 예쁠 때라고 하는데, 이 때의 내 몸으로 평생 살면서 언제 해보겠나 싶기도 했죠. 가장 예쁠 때 모습을 너무 아름다운 화면에 간직해뒀다가 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랑할 만한 영상물을 남겼다는 개인적 욕심도 있답니다.”
피아니스트가 오랜 꿈이었던 이유영은 고등학교 졸업 후 글쓰기, 언어 선생님, 각종 아르바이트 등을 한 뒤 이윽고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 출신의 이유영은 입시 과정과 연기 공부에 대해 “만만하게 봤다가 큰 코 다쳤다”고 언급했다.
“‘평생을 공부하고 배워도 끝이 없겠구나. 배우로서 필요한 것을 해나가는 게 내 인생의 큰 자산’이란 걸 느꼈어요. ‘이렇게 평생 배우하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좋은 배우가 되려면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겠구나. 난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고, 평생 배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합격했답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좋은 사람’이란 무엇일까.
“몸가짐, 마음가짐을 단정히도 해보고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어울리고 남 얘기할 시간에 운동화 신고 트레이닝복 입고 백팩 메고 도서관에 가서 책 한권 다 읽고요. 혼자 클래식 음악도 들어보거나 전시회도 가보고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보기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 내 몸도 챙기고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고요. 하나하나 변해가기 시작했답니다.”
갓 데뷔해 비교적 큰 성과물을 얻어낸 신예 이유영은 긴 숨을 바라보고 있는 ‘배우’였다. 이는 그녀가 가능성을 움틔운 채 파릇한 봄날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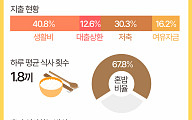







![[정치대학] 최진녕 "동종 전과 있는 이재명, 집행유예인 걸 감사해야"](https://img.etoday.co.kr/crop/320/200/210423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