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와 회동·재무상태·거시경제 등 다각적으로 평가…신뢰성 놓고 논란도 끊이지 않아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한 가운데 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신평사의 국가신용평가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대 신평사의 역사는 철도 건설, 서부 개발 등 미국의 자본주의 시작과 함께 무려 100여년 전부터 시작된다. 철도회사에 대한 신용등급을 분석했던 업체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평가 시스템을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금의 입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들 3대 신평사가 글로벌 신용평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는다. 신용평가사의 임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면 해당 원금과 이자를 제 때 상환할 수 있는지 전망을 평가해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다.
신용평가사들은 채권 발행 주체로부터 신용평가 의뢰를 받아 책임자들과 회동하고 재무상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뒤 국가면 그 나라의 거시경제 상황과 전망, 업체면 업계동향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 신용등급을 매긴다.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신용등급은 투자 결정의 중요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국채 금리와 주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3대 신평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들이 매긴 신용등급의 신뢰성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8월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70년 만에 ‘트리플A(AAA)’에서 ‘AA+’로 강등했을 때 비난이 빗발쳤다.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자산이 안전하지 않다는 평가는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무디스와 피치 등 다른 신평사가 여전히 트리플A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S&P만 등급을 낮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신평사들은 신뢰를 잃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월 S&P가 주택담보증권의 신용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투자가 과열돼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며 약 1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도 신평사들은 유럽 각국 신용등급을 높게 평가했다가 위기가 터지자 갑자기 등급을 잇따라 내려 위기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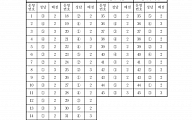







![[정치대학] 박성민 "尹대통령, 권위와 신뢰 잃었다"](https://img.etoday.co.kr/crop/320/200/21016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