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부 차장

약 한 달 전 상장폐지된 한진해운과 ‘오버랩’된다. 한때 ‘정부 지원 형평성’이라는 도마 위에 올랐던 두 회사 모두의 운명이 결국 증시에서 사라지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이 돼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정부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던 대우조선해양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쏟아부었던 반면, 한진해운에는 왜 그토록 엄격했는지 말이다.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가 자라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부모에게 철없이 하소연하는 것 같지만 말이다. 대우조선해양 지원 규모의 딱 10분의 1만 지원해 줬어도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은 지금도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었을 것이다.
그 와중에 정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자금 약 2조9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추가 지원 계획을 언급, 또 한 번 형평성 논란을 수면 위로 올렸다. 정부와 채권단이 2015년 7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추가 지원은 없다”고 한 약속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지원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회사채 투자자도 채무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부’이다. 이게 왜 논란이 될까. 설명하자면 조건이라는 것이 “만기를 늦추고, 빚을 주식으로 바꾸면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2조9000억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규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달리 말해, 이는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 한진해운은 어땠나. 조 단위도 아닌 6000억 원 지원에 대해 채권단의 ‘불가’ 결정이 내려지면서 결국 파산하지 않았는가.
물론 정부는 해명한다. 두 회사의 지원 규모가 달랐던 것은 파산 후 경제 손실 규모와 없어지는 일자리 수가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그 말은 맞다.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할 경우 국가 경제가 입을 피해는 57조 원으로 추정되며, 4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한진해운의 경우 손실 규모 1년 기준 17조 원, 근로자 수 2300여 명이어서 대우조선해양과 직접적인 비교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어땠을까. 40여 년에 이르는 네트워크와 영업력, 국내 1위는 물론 세계 7위라는 위상을 자랑했던 한진해운이다.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간산업(基幹産業)에 해운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진해운이 무너짐으로 전 세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금융당국의 무심함이 서운할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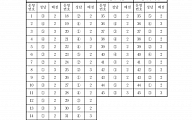







![[정치대학] 박성민 "尹대통령, 권위와 신뢰 잃었다"](https://img.etoday.co.kr/crop/320/200/21016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