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미 정치경제부 정치팀장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구청장이 “코로나19로 B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A 주민들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좀 주셔야겠습니다!”라고 통보한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A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급기야 구청장은 “아니, 꼭 강제로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자발적 참여인 셈이죠. 그러면 구청에서도 해당 가구에 대한 혜택도 고민해보겠다는 거죠”라고 말을 바꾼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이익공유제’가 딱 이런 상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내 정책 담당자들은 과연 이 제도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곰곰이 따져보고 공론화를 시켰을지 의문이다. 얼핏 보면 말은 그럴싸하다. 이익을 공유하자는데 싫어하자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지른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의구심이 든다.
개념도 모호하지만,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온갖 아이디어만 난무하고 있다. 그냥 혼란스럽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초과이익공유제’는 그나마 같은 사업을 한다는 ‘연관성’이 있는 기업 간의 이익 공유이자, 고질적 문제로 이어져 온 원·하청업체 간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가 내포돼 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의 ‘이익공유제’ 대상 집단은 ‘코로나 수혜업종’과 ‘코로나 타격업종’으로 사업적으로 대부분 관련 없는 별개 집단이다. 게다가 수혜 원인도 코로나 때문만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그나마 실체로 드러난 이익공유제의 방식들도 개념이 모호하다. ‘배달의 민족, 카카오 등이 자영업자·배달업자 수수료 인하’안을 예로 들어보자. 방식만 따져보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다른 바 없다. 이런 애매한 구분이라면 코로나로 수혜 입은 착한 임대인도 이익공유제 대상이 돼야 할까. 그 외 해외업체, 수수료로 먹고사는 기업들은?
또 그동안 이익공유제를 비판해 온 국민의힘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최근 꺼내 든 소상공인 지원책도 민주당 논리로 보면 이익공유제 일환이라 볼 수도 있다. 나 전 의원은 최근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적발하고 배달 수수료의 하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언급했다.
‘자발성’도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린다. 일례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1%도 안 된다. 또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을 기대하며 조성한 ‘농어촌 상생협력지원금’은 10년간 1조 조성이 목표지만, 3년간 겨우 1000억 원이 모였다. 연간 매출 100조 원에 육박한 재벌기업 A가 1년간 낸 금액이 5억 원도 안 됐다면, 또 1원도 내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수 있다면 짐작이 갈 것이다.
이쯤 되면 이익공유제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 싶어진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만 효과는 글쎄, 민감한 세금문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책임은 회피, 얼핏 보면 그럴듯하지만 생산성은 없는 논의들. 정말 이 시국에 이익공유제가 최선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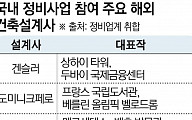


![[찐코노미] ‘D-1’ 美 대선, 초박빙…글로벌 금융시장도 긴장](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74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