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정치경제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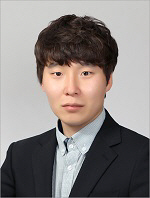
이미 관계 법령(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에 시행을 미룰 방도가 없지만,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되는 공직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매주 수요일이면 LH 노동조합을 비롯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후문에서 집회를 연다. 공직사회 내에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번 대책의 취지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근절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도 보고해야 한다.
쟁점은 수단의 적절성이다. 근본적으론 정부가 공직자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부동산 취득에는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자연인’으로서 공직자는 비공직자와 다를 게 없다. 20·30대의 상당수는 ‘내 집 마련’이 최대 목표일 것이고, 퇴직을 앞둔 공직자라면 노후소득 마련이 최대 관심사일 것이다. 상속·증여로 계획에 없던 부동산 취득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공직자란 신분과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앞으론 이런 사생활들을 공직자란 이유만으로 정부에 의해 관리·통제받아야 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복권에 당첨돼 토지·주택을 구매하게 돼도 업무 특성에 따라 복권 당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공직자란 이유만으로 공적 업무와 무관한 모든 사생활을 감시받고 통제받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이다. 기저에는 ‘공공은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국민의 혈세를 공복으로 받는 이들에게 통제는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깔렸을 것이다. 자동차 안전벨트 의무화 입법이 ‘국민의 자유’ 논쟁으로까지 확대됐던 미국의 사례와 상반된다.
부정부패, 적폐를 단절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취지만큼 수단도 중요하다. 행여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효과를 낸다고 해도 해당 정책이 공직자들의 사기와 의욕을 꺾어 무사안일을 조장하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입을 가로막는다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다.











![스타벅스 2025 다이어리 시즌…연말 겨울 굿즈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921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