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우 금융부장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 정책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감독 집행과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기관에 속한다. 종합하면 금융위가 총감독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산업 육성에 정책의 키워드가 맞춰져 있는 만큼 감독 기능에서의 허점이 항상 문제가 됐다. 매년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금융사고가 그 방증이다. 이 같은 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목적은 정책과 감독을 모두 맡는 금융위의 권한을 분산해 관치금융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서로 권력을 더 가지려는 두 기관의 알력 다툼에 관치금융을 넘어 정치금융의 그림자도 더 짙어졌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목줄을 놓지 않으려 정치권에 손을 뻗었고, 금감원은 금융위 지휘에서 벗어나려고 여의도를 뛰었다.
‘징계 권한’을 놓고도 매번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결국 중징계 이상은 금융위의 의결을, 경징계는 금감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정한 징계를 금융위가 뒤엎고, 이에 금감원이 반발하는 일이 반복되는 촌극을 낳았다. ‘책임’에 있어서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기능과 권한의 구별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사태가 터졌을 때 금감원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를 지목했다. 반면 금융위는 감독 권한을 가진 금감원이 시장의 관리감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사태 원인 규명과 수습을 위해 두 기관이 어떤 협업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사리지고 소비자 피해와 규제 강화 그리고 금융회사 징계만이 남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각기 다른 금융감독체계를 갖고 있다. 정답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확인됐다.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방치하는 기형적인 금융당국이라는 비판은 확실하다. 그런데도 금융당국 수장들은 개편에 반대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감독체계는 ‘정답이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
결국,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치권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에서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구체 사안은 법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핵심은 ‘금융위 해체’라는 점은 공통 사안이다.
여권에서는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던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두 개로 분리해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가 담당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 중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및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및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담당토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야권에서는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금감위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이처럼 여야가 발의한 법안들의 공통점이 ‘금융위 해체’란 점이 눈에 띈다. 달리 말하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금융위 존속은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린 사안이다. 내년 3월 대선 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대전제를 인지하기 바란다. 소비자 보호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 출발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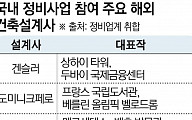


![[찐코노미] ‘D-1’ 美 대선, 초박빙…글로벌 금융시장도 긴장](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74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