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나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에게 고객들의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도록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 조항이 아니라 반쪽짜리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정비될 가상자산 업권법에 거래소의 파산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2014년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사건이 마무리됐다.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였던 2013년 마운트곡스는 해킹 피해로 약 85만 비트코인을 탈취당했다. 이후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만을 회수한 마운트곡스는 법원으로부터 회수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에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상 해킹 당시 보유하던 비트코인 수량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할지, 시세를 기준으로 환전해 지급해야 할지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난 11월 손해 배상안이 채권단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며 지난 7년간의 논의가 마무리됐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던 채권자는 해킹 당시 비트코인 보유 수량을 기준으로, 이외 가상자산은 해킹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환전해 지급받는다.
업계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마운트곡스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업비트ㆍ빗썸을 비롯한 대형 거래소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만큼, 관련된 법 조항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파산시 조세나 임금채권이 최우선”이라며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 고객들이 가져갈 수 있는지, 파산 당시 가상자산 가액 상당의 원화 채권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일절 없다”라고 지적했다.
기존 금융와 비교해 가상자산 업계의 투자자 보호 조항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기존 금융사의 경우 예금자보호금 제도를 운용,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별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식 역시 예탁결제원에 증권을 맡기도록 해 증권사가 파산해도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특금법은 자금세탁에 대한 요건들을 심사하는 것이지, 시세조종이나 이용자 보호에 대한 건 심사 요건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며 “FIU나 금융감독원이 보완 차원에서 지적은 가능하겠지만,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업권법에 파산 관련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산 시 일반 채권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범주 및 기준은 무엇인지, 거래소가 파산ㆍ회생 절차 중 어떤 절차를 반영해야 하는지 등이다.
업계 전문가는 “거래소에서 자기 자산과 고객 예탁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향후 업권법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갈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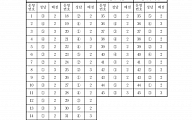







![[정치대학] 박성민 "尹대통령, 권위와 신뢰 잃었다"](https://img.etoday.co.kr/crop/320/200/21016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