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우 잠이 드려는데 창밖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닫아도 귀에 꽂히는 강력한 후크송(짧은 후렴구에 반복된 가사)이었다. 무시하려 했지만 이미 뇌리엔 ‘o번! ooo!’ 가사가 붙어버렸다. 간신히 낮잠을 재운 둘째아이까지 깨 칭얼대니 짜증이 났다. ‘선거 때니 이해하자’고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다. 얼굴이라도 봐야 저 후보를 찍든 말든 할 게 아닌가. 그런데 유세 차량엔 아무도 없었다. 스피커만 울려댈 뿐이었다.
우리나라 선거운동 소음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정격출력은 3㎾이고, 음압 수준 127㏈이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록밴드 공연을 맨 앞에서 보는 것과 비슷하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와 시ㆍ도지사 선거는 제트기 엔진 소음에 버금가는 150㏈까지 허용된다. 사람이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기를 견뎌낼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한다. 극심한 고뿔 속에서 난 내 한계를 시험받은 셈이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선거 운동의 지침을 담은 ‘선거 공직법’은 1994년 제정됐다. PC 통신이 막 보급되던 시절이다. 접점이 부족한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후보의 연설을 들었다.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는 정치인들의 세(勢)를 가늠하는 척도였다.
도시 소음 속에서 유세장에 모인 수천~수만 명의 귀를 사로잡으려면 ‘그 무엇보다 큰 소리’가 필요했다. 들판에서 밭일하는 농부에게도, 시장통에서 호객하는 상인에게도 딱 꽂혀야 했다. 그게 지금 유세 소음의 기준 배경이다.
1997년 김대중ㆍ이회창ㆍ이인제 후보가 맞붙은 10대 대통령선거에 TV토론이 활용되면서 청중 유세는 줄기 시작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청중은 빠르게 디지털 속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단상 위 확성기는 여전히 그 자리다.
불과 석 달 전 대선에서 ‘유세 버스 참변’을 겪고도 매일 아침 도로 한가운데 불법 정차해 있는 유세 차량을 보면 과연 그들은 알을 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선거 운동원부터 노래, 현수막, 차량, 부동산(사무실)까지 선거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이 ‘하나의 산업’이 된 상황에서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결단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것처럼 말이다.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유세 도중 시민이 던진 그릇에 머리를 맞는 사건이 있었다. 명백한 범죄다. 피의자 편을 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발언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한낮의 조용한 주택가에 제트기 소음 수준의 후크송을 틀어 놓고 공약도 설명 않는 선거운동이 과연 ‘민주주의’일까. (그 후보가 여당은 아니었다) 지하철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억지스럽게 명함을 쥐여주는 게 그들이 말하는 ‘축제’일까.
아마도 그 답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는 어르신과 플랫폼 쓰레기통에 명함을 내던지는 청년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에서 면접을 보고, 가상의 인물이 가수로 데뷔하는 시대다. 어르신들도 유튜브로 요리법을 배우고, 새 농사법을 익힌다. 정치인들은 유권자 하나 없는 ‘광장’에 머물지 말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득한 디지털로 들어와야 한다. 지금 당장 바뀌지 않으면 투표율 50%대에 머무는 ‘그들만의 축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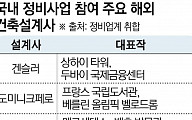


![[찐코노미] ‘D-1’ 美 대선, 초박빙…글로벌 금융시장도 긴장](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74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