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서강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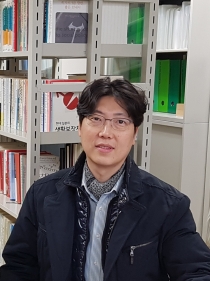
한국 사회는 급속한 근대화와 압축 성장을 겪으며 많은 것이 빠르게 변화되었다. 죽음을 둘러싼 문화적 의미와 행위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골에서처럼 상여 행렬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1980년대까지 서울의 일반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 단지에서도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낯선 풍경은 아니었다. 1980년 망자의 80% 이상이 집에서 임종했고, 병원 임종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병원 임종이 주택 임종을 넘어선 것은 20년 전이었고, 지금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사고사(事故死)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임종은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아마도 병원에서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죽음을 늦추기 위한 온갖 의료적 처치, 의사에 의한 즉각적인 사망선고, 그리고 장례식장으로의 시신 이송과 장례절차까지. 죽음마다 제각각의 사연이 있겠지만, 임종에서 장례까지 한국인의 죽음은 매우 표준화되어 있다.
병원 임종의 일반화는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원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죽음을 (자연으로) ‘돌아가셨다’고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의료의 발전과 더불어 어느 순간 죽음은 나쁜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죽음은 좋지 않은 것이므로 집에서 맞도록 둘 수 없고, 최대한 죽음을 늦추는 의학적 처치가 필수적인 통과의례로 자리 잡았다. 오랜 세월 집에서 투병했어도 마지막 임종 장소는 병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병원은 집이 아닌 객지(客地)에 해당하므로 병원 임종은 객사(客死)와 다름없다.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죽음의 모습이다.
여러 연구에서 한국의 노인들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고통 없이 내 집에서 죽는 것을 이상적인 죽음의 모습으로 여기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온갖 의료장비를 주렁주렁 매달고 주삿바늘이 온몸에 꽂힌 채 중환자실에서 홀로 죽어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그런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그럼에도 천편일률적인 죽음의 현실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은 죽음에 대한 성찰과 준비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망자보다는 남은 가족의 삶을 생각하고, 다가오지도 않을 나의 죽음을 떠올리기보다는 당장의 삶이 버겁기 때문일까. 나이가 많고 적건 간에 죽음은 불편하고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집착하고 죽음을 외면한다. 그러나 누군가 말했듯 인간의 삶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는다는 것이고, 가장 불확실한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죽음을 성찰하고 준비하는 것은 삶의 질만큼 중요한 죽음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일 것이다.
그리고 그 준비가 개인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도록 사회제도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는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구호이다. 이제 국민들의 웰빙(well-being)뿐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원래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 경구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니.











![[정치대학] 美 대선, 막판까지 초박빙…당선자별 韓 영향은?](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81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