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의 암울한 전망도 이어졌다. 지난해 0.78명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올해 0.72명, 내년 0.68명을 거쳐 3년 후인 2025년 바닥(0.65명)을 찍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해에 사망자가 출생자를 역전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인구 인구 감소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1년 5000만 명 선이 깨지고, 2064년 4000만 명 선이 무너진다. 2072년에 3622만 명까지 인구가 급감한다. 유례없이 가파른 감소세다. 통계청은 50년 뒤 합계출산율을 현재보다 개선된 1.08명으로 예측했지만 그렇다고 인구 감소 상황이 반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인구가 유지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 돼야 한다고 봤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수준이 OECD 1위라는 오랜 오명은 이미 무감각해질 정도로 익숙하다. 하지만 최근 연타로 나온 이런 경고의 무게는 제법 무겁다. 특히 그간 300조 원이라는 가늠하기도 어려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받은 성적표가 이 정도라는 사실은 처참하다. 무엇보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예측이 다소 낙관적인 편이란점을 감안하면 현실은 더 가혹할지도 모른다.
이제 시간과 싸워야 한다. 위기가 눈앞에 두고 뜬구름만 잡고 있을 수 없다. 한국은행은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인구구조가 붕괴되면 노동시장이 흔들리고, 노동력이 급감하면 기업들은 인력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국가 재정 및 복지, 안보, 지방 도시 소멸 등의 연쇄적인 재앙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집값, 고용,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구상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약 및 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 프레임도 깨야 한다. 보육 인프라와 재정 구조 등 사각지대 없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간의 매몰비용이 아까워 꾸려온 정책에 집착하는오류를 범하거나,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인식은 국가의 소멸을 앞당길뿐이다. 책임감과 절박함이 필요하다.
정부 만큼 저출산 문제의 최전선에 나서야 하는 주체가 기업이다. 소 닭보듯 소극적이기엔 인구 감소라는 폭탄이 기업에 주는 타격은 상당하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 인구 급감은 도시 소멸과 인력난 고착화를 야기하는, 존립을 흔드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근로자 81%가 일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저출산 정책과는 유독 거리가 멀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육아 단축 근무제, 난임휴가, 유연근로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하고 싶지만, 현실은 출산휴가만 써도 눈치 보기가 급급하다. 자신을 해고하려는 회사와도 싸워야 한다.
정부는 육아휴직제도 활용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매칭으로 공백을 지원하고, 인센티브 강화를 더 강구하는 등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노후화된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보육 수요를 찾아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말뫼의 눈물’로 알려진 스웨덴 말뫼처럼 쇠퇴하는 지역 도시에 창업, 거주가 동시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거시적 접근도 필요하다.
기업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고 복지를 개선하는 등 자구책도 고민해야 한다. 젊은층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낮은 연봉과 열악한 복지, 경계 없는 업무, 강압적인 조직 문화 등인 경우가 많다. 언제까지 ‘좋좋소’(좋소 좋소 중소기업)로 불리며 풍자의 대상으로 설 수 없지 않나. 온갖 대외 악재와 불공정에 풍전등화처럼 휘둘리는 작은 기업이더라도 저출산이라는 미증유의 위기 앞에나란히 함께 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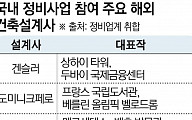


![[찐코노미] ‘D-1’ 美 대선, 초박빙…글로벌 금융시장도 긴장](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74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