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저출산 위기 정책전환 실기
‘우울한 현실’ 바뀌어야 출산율 올라

전 세계 200개 국가 중 GNP 196위를 기록하던 1960년, 한국의 합계출산률은 6.2명을 기록했다. 가장 헐벗고 굶주리던 나라에서 인구 폭증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정부가 1961년 가족계획정책을 발주하게 되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오죽하면 첫 표어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였을까. 사업 시작 후 불과 20여 년 만인 1980년, 출산율을 2.83명으로 떨어트렸으니, 가족계획사업은 대성공을 이룬 셈이다. 그리고 5년 후인 1985년, 합계출산률은 1.85명을 찍으며 위기 경보를 알렸다.
하지만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에 심취해 있던 정부는 초저출산 위기가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거나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만원’이란 표어와 포스터를 곳곳에 내걸었다. 물론 ‘대한민국은 땅덩어리도 좁은 데다 자원은 부족한데 인구가 너무 많다’는 고정관념도 한몫했다. 돌이켜보면 정책 전환의 적기(適期)를 놓친 것이, 아울러 유통기한 지난 고정관념에 발목 잡힌 것이, 얼마나 뼈아픈 실책인가를 되새기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 만큼 이 시점에서 가족계획사업의 성공 요인을 복기(復棋)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가족계획사업은 국가의 인구정책과 가족의 자녀 가치관, 그리고 여성의 엄마 역할을 둘러싸고 3주체 간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민관 합작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가족계획의 성공 요인으로 지금까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족계획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금욕적 생활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피임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지면, 진정 행복한 부부중심 핵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많은 가정에 배포된 잡지 ‘가정의 벗’에는 만족스런 성생활 가이드가 인기리에 연재되었다는 자료도 있다.
지금도 우리는 가족계획사업을 떠올리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명품 표어를 떠올린다. 그만큼 한국인의 일상에 이 표어가 깊이 뿌리내렸다는 방증일 것이다. 물론 딸 아들 구별해서 아들만 골라 낳고 출산율만 획기적으로 떨어트림으로써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했던 흑역사가 있긴 하다. 문맹률이 높았던 사업 초기, 농촌 지역에서는 체내 삽입형 피임약의 사용법을 몰라 먹는 약인 줄 알고 한 달간 복용했다는 웃픈 이야기도 전해온다. 가족계획을 진두지휘했던 전문가 집단과 가족계획을 실천에 옮겼던 대한어머니회 간에 갈등과 알력이 있었음을 증언하는 기록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전 국민적 지지를 폭넓게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은, 저출산 위기 앞에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선심성 공약이 물밀 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저출산 이슈가 워낙 뜨겁다보니, 각 당에서 저출산 대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그래도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게 될 세대에게 한 번만 물어보자. ‘아빠 육아휴가 1개월 의무화’(국민의힘 정책)하고 ‘신혼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민주당 정책) 해주면 정말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는지 말이다.
지난 20년의 저출산 정책은 돈 쏟아 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주었다. 선거를 앞두고 쏟아내는 정책 또한 대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일일 반창고를 붙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미국 작가이자 인플루언서인 마크 맨슨이 한국을 다녀가며 만든 동영상이 화제라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란 자막이 달리고, 유교와 자본주의의 약점, 지나친 경쟁과 집단주의 그리고 물질만능주의가 결합한 결과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각자도생 사회에서 아이는 돈 먹는 하마요, 출산은 독박육아와 경력단절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우울한 담론’과 금수저 흑수저 간 생애기회가 점점 벌어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차 요원해지는 ‘더욱 우울한 현실’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합계출산율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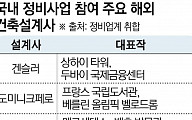


![[찐코노미] ‘D-1’ 美 대선, 초박빙…글로벌 금융시장도 긴장](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74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