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엽 문화부 차장 겸 스포츠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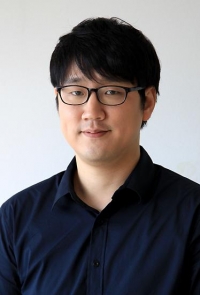
국내에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프로 종목들이 많다. 하지만 선수 대리인(에이전트)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은 종목은 없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공인시험을 통과하면 에이전트로 일할 수 있는 축구가 그나마 활성화돼 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은 에이전트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활동하는 사람들도 극히 제한적이다.
국내에서도 에이전트 제도의 필요성이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에이전트 제도는 선수는 물론 구단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도다. 시즌 중 훈련과 경기에 매진해야 하는 선수가 시즌 종료 후 자신의 가치를 구단에 어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료를 모을 충분한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전문성도 떨어진다. 결코 편안하지 않은 협상 테이블도 피할 수 있다. 구단 입장에서도 선수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에이전트와 대화하는 것이 편할 수 있다. 대부분 선후배 간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하기 어려운 말을 대신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각 종목 협회나 연맹 차원에서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함량 미달의 에이전트는 스포츠계에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이다.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일부 에이전트의 몰상식한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 다른 에이전트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를 가로채거나 외국인선수의 몸값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수수료를 높이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선수를 가로채는 부도덕한 에이전트가 자신의 선수에게 성심을 다해 일할지는 미지수다. 선수 몸값을 부풀리는 행위 역시 단기적으로는 이익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외국에서 보는 한국 시장의 수준을 낮게 만드는 행위다.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통해 이 같은 폐해를 줄일 수 있다. 스포츠 판 자체가 자신들의 지저분한 행동으로 더러워지면 스스로 일할 분야도 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라스는 분명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에이전트다. 그는 철저하게 시장논리에 따라 구단과 협상하고 선수 편에서 최고의 계약을 이끌어낸다. 보라스가 만들어낸 결과에만 주목해선 안된다.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에이전트 스스로 페어플레이를 할 때 ‘한국판 보라스’의 탄생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롤 프로리그 이적시장, 한국 선수들의 ‘컴백홈’ 러시 시작될까 [딥인더게임]](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691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