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 20여년 만에 내 작품들고 무대 밟아

한국 뮤지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그의 존재는 한국 뮤지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뮤지컬의 개척자인 에이콤 인터내셔날의 윤호진 대표(66)다. 윤 대표로 인해 한국 뮤지컬의 역사가 본격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부터 했으니 40년이 넘었죠. 원래 영화감독이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연극에 푹 빠졌어요.” 자신을 할리우드 키즈라고 소개한 그가 본격적으로 뮤지컬에 빠져들게 된 건 1982년 문예진흥원 해외연수 덕에 접한 본고장의 뮤지컬 ‘캣츠’ 때문이었다. “운이 좋았죠. 영국 내셔널 시어터(국립극장)와 로열(왕립)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옵서버(Observer)로서 막 올라가는 전 과정을 참여했어요. 특히 그때 본 ‘캣츠’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연 장르가 있나’란 생각을 들게 만들었죠.”
이를 계기로 그는 오로지 ‘내가 만들 뮤지컬은 뭘까’란 고민에 빠졌다. 뮤지컬 공부를 위해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1984년 미국 뉴욕대학교 대학원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100주년이 되는 해인 1996년 뮤지컬 ‘명성황후’의 그 빛나는 첫 막이 올랐다. “미국에서 1987년에 돌아왔는데, 1997년에야 비로소 내 작품 ‘명성황후’를 완성할 수 있었죠. 유학 당시 내 마음에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란 결심은 오로지 신념만으로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만든 ‘명성황후’는 아시아 최초로 뮤지컬 본고장인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 무대에 섰다.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연수한 지 20년, 미국 뉴욕에서 공부한 지 10년 만에 양대산맥 같은 곳에 내 작품을 가지고 돌아가는 기분은…”
그는 ‘명성황후’로 미국에 진출할 때도 가진 돈 하나 없이 밀어붙였다. 결국 호평 끝에 국내 창작뮤지컬의 자존심으로 우뚝 섰다. 공연을 통해 계속 막음하는 구조였다. 한편 그는 3000억원대 규모로 급성장한 국내 뮤지컬계에 많은 제작자들이 무모하게 다가오는 데 아쉬움을 표출했다. “지금 공연 시장이 흑자를 내는 상황이 아니에요. 외연이 커진다고 이 계통에 달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허황된 꿈을 가진 사람도 너무 많고요. 배우의 숫자가 비교적 적다보니 개런티는 천정부지로 치솟죠. 모순된 구조가 계속 되고 있어요. 펀드에 의해 움직이기도 하지만, 남아야 펀드가 되지, 적자를 보는데 어떻게 펀드가 되겠어요.”국내 대표 연출자로 손꼽힌 윤 대표는 대통령 취임식, 소치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폐막식 공연을 도맡았다.
이를 정치적 이유로 해석하는 데 선을 긋는다. “정치는 제 몫이 아니에요. 연출해야지요. 다만 대통령이 뮤지컬 보러 와준다면 작품 흥행에 도움이 되겠죠.” 항상 비장미가 흐르는 그의 작품에선 역사적 통찰이 두드러진다. “상황이 어렵다고 갑작스럽게 내가 살아온 삶의 변주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뮤지컬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죠, 원래 꿈이 영화감독이었으니.” 오는 10월 막 올리는 뮤지컬 ‘보이체크’ 속 처절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의 눈동자는 빛났다.
전 세계적 희곡사의 수작 ‘보이체크’의 결말을 하나의 ‘씻김굿’으로 재해석한 것은 윤호진 대표다운 표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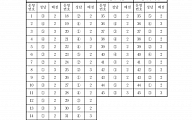







![[정치대학] 박성민 "尹대통령, 권위와 신뢰 잃었다"](https://img.etoday.co.kr/crop/320/200/21016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