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유토피아’, 엄태화 감독, 2023년 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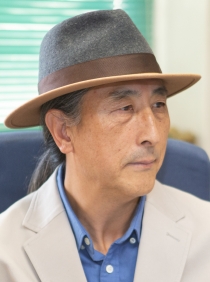
이와 같은 함의를 놓고 보면,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엄태화 감독, 2023년 8월 9일 개봉)는 제목을 ‘콘크리트 헤테로토피아’로 바꿨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여하튼 이 영화는 필자에게 ‘오늘의 우리가 어떤 집, 어떤 지배적 주거 형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화에 대한 가치평가나 분석적 접근을 미뤄두고 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집은 우리의 일상이 켜켜이 쌓여가는 특별한 장소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주거문화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의 형태로 대표되며 강고히 자리잡혀 왔다. 우리나라는 왜 아파트 공화국이 됐을까? 전쟁과 힘겨운 복구 과정에서 도시는 너무나 급격하고도 기형적으로 비대해졌다. 이어진 조국근대화 과정에서 국가는 도시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만큼의 여유(돈·시간)나 여지(전문성·상상력)가 없었다. 경제발전에 힘을 쏟는 사이에 신흥 부자와 중산층이 갑작스레 대규모로 등장했다. 그들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동네와 집 소유 욕구가 있었지만 나라에서 그와 같은 동네 조성이나 기반시설을 구축해주지 못했다.
이때 유일한 대안으로 등장했던 것이 아파트였다. 국가가 맡아야 할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민간기업이 개별 아파트 단지 형태로 부분 해결해 판매하고, 이것을 국민이 자기 돈을 주고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개인이 주택을 지을 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반면에 아파트는 정부가 나서서 팔아주려고 애쓰는 집이었다. 아파트를 수요 이상으로 팔아주기 위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선 분양제도’를 실시해 왔고, 거치 기간을 둔 주택담보대출 역시 이를 뒷받침해왔다. 아파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게 만들고, 아파트라는 욕망에 불을 붙여온 것은 역대 정부의 주택(신도시)정책과 사회적 방치의 결과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는 부동산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액면가 큰 화폐나 유가증권의 구실을 하고 있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고, 현금과 다름없이, 시장에서 교환가치가 광범위하게 인정돼오고 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수다한 모순성, 사람들의 애증과 갈망이 들어 있는 커다란 상징기표로 자리매김돼 있다. 위생, 냉난방, 치안, 프라이버시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대다수 시민의 결론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아파트’다. 단지 안에 들어가는 순간 밖에 있는 공공 공간의 질적 열악으로부터 벗어난 신세계, 모두가 염원하는 헤테로토피아가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내의 개별 세대는 철저히 표준화·규격화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그렇기에 그 속에는 헤테로토피아로 삼을만한 공간이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디 또 있을까 싶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김숭늉의 웹툰 ‘유쾌한 왕따’와 그 후속편에서 영감을 받아 윤색 과정에서 극적 전제와 배경, 그리고 인물 캐릭터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냈다. 제작비 200억 원에 달하는 텐트폴 영화로 세계 152개국에 선판매됐고, 국내 흥행도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재난영화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재난 상황의 스펙터클 재현에 집중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앙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 속에서 기적적으로 유일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남은 한 구축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우리의 주거문화와 삶의 위계를 순식간에 뒤집는 대재앙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과 극적 전제만으로도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아파트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거환경과 문화를 되짚어보도록 하는 특별한 상징기제로써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단연 (황실)아파트 자체다.











![롤 프로리그 이적시장, 한국 선수들의 ‘컴백홈’ 러시 시작될까 [딥인더게임]](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691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