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규제 강화ㆍ고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 부담 영향

신기술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 대신 합작사나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준합병’을 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컨설팅업체 안쿠라(Ankura)를 인용해 지난해 합작사 및 파트너십 체결 건수가 40%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기업의 대형 인수 합병 건수나 규모 성장세는 교착상태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대표적인 사례가 디즈니다. 디즈니가 보유한 스포츠채널 ESPN네트워크는 지난 2월 경쟁사인 폭스와 워너브로스디스커버리의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스포츠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디즈니는 같은 달 인도에서도 비아콤과 인도 대기업 릴라이언스 산하의 스타인디아를 합병해 새로운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인도에서 해외 기업으로서의 한계를 딛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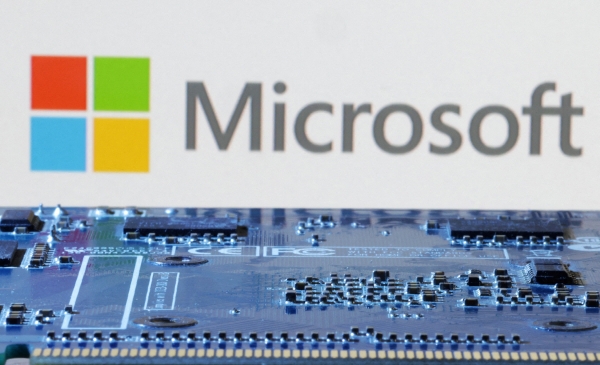
디즈니뿐만이 아니다. 인공지능(AI) 개발업체 오픈AI사와의 파트너십으로 재미를 봤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월 유럽판 오픈AI라는 평가를 받는 프랑스 스타트업 미스트랄(Mistral)에 이어 이달에는 ‘AI 신성’으로 불리는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AI기업 g42와 투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 MS는 미스트랄과 g42의 소수 지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AI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다. 아마존도 앤스로픽에 40억 달러를 투자해 이 회사가 보유한 ‘클로드3’ 모델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보했다.
자동차 업계의 합작사·협업도 두드러진다.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과 협업 관계를 맺고 미국 미시간주에 35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의 규제에 대응해 직접 자본 투자가 아닌 배터리 기술 라이선스를 완성차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스텔란티스는 삼성SDI와 미국 인디애나주에 건설 중인 합작 배터리 공장의 49%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준합병(quasi-merger)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각국 규제 당국이 독점금지법 등을 이유로 기업들의 M&A에 제동을 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다, 금리 인상 기조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완전히 합병하는 방법 대신 다른 기업과 자본, 자원을 결합하는 방식을 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기업들의 준합병 전략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특히 기업들은 프로젝트의 비용을 관리하고, 현지 생산을 요구하는 정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현지 파트너와 합작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은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고, 현지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을 이전받았다.
다만 기업들의 이러한 ‘준합병’ 물결이 모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파트너십이나 합작사 설립은 규제 당국의 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변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메리칸에어라인과 제트블루는 2021년 이른바 ‘북동 연합’(Northeast Alliance)을 추진했으나 미 법무부가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자 지난해 노선통합 사업을 종료했다. 디즈니의 새로운 스포츠 OTT 서비스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AI 관련 투자와 파트너십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적이 다른 기업 간의 합작사 설립이나 파트너십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도 리스크로 꼽힌다.











![롤 프로리그 이적시장, 한국 선수들의 ‘컴백홈’ 러시 시작될까 [딥인더게임]](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691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