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바이오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을 둘러싼 의견이 팽팽하다.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은 상장 문턱 완화를 원하고, 상장을 책임지는 한국거래소는 심사가 엄격해야 한단 의견이다. 그동안 상장폐지(상폐) 위기에 몰리거나 구설수에 오른 바이오기업이 많아 양측 입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약개발 산업을 생각하면 다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계는 피라미드 형태를 신약개발의 이상적인 구조로 꼽는다. 개발의 시작인 기초연구나 후보물질이 신약개발을 지탱하고, 전임상-임상-상업화 등 점진적으로 나가는 구조다.
좋은 예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다. 렉라자는 바이오기업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가 연구하다 국내 톱(TOP) 제약사 유한양행에 기술이전했다. 이후 유한양행은 글로벌 빅파마 존슨앤드존슨에 다시 이전했고, FDA 허가를 받은 첫 국산 항암 신약이 됐다.
바이오기업이 최대한의 후보물질을 발굴해 자본이 탄탄한 기업의 선택지를 넓혀 임상과 상업화를 달성하는 구조다. 바이오기업이 좋은 후보물질을 많이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필수다. 이를 위해 자금 조달 목적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문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사는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다.
다만 문턱을 낮춘 만큼 과감한 상폐 제도도 필요하다. 현재는 상폐 종목에 지정돼도 회생할 기회가 많다. 업계의 마지막 상폐는 2013년 알앤엘바이오다. 이후 11년간 바이오기업의 많은 논란에도 주주 보호란 명분으로 상폐는 없었다. 이렇다 보니 기업은 상장 유지를 위해 신약개발 등 본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펼쳐, 상장 의미가 퇴색하며 다수의 좀비기업을 양산했다.
상폐 직전인 기업의 주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업계 전체와 잠재적 투자자를 위해서라도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한다. 건강한 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새살이 돋는다. 상폐 위기 바이오기업을 구제할수록 업계 이미지는 나빠지고 투자도 경직된다. 썩은 살을 과감히 도려내면 바이오 투자시장은 더 건강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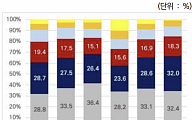

![[컬처콕 플러스] 아일릿, 논란 딛고 다시 직진할 수 있을까?](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591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