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복을 갖춰 입고 진중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을 보면 무섭고 긴장될 때가 있다. 법무부 고위 인사로 재직하다 변호사가 된 법조인도 재판에 가면 떨린다고 한다.
법원이 생소한 대부분의 사람은 더 어려움을 느낄 듯하다. 판사의 법대는 유독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사들의 따뜻한 마음이 거리감을 좁히는 사례도 많다.
어느 작은 지방법원의 이혼 사건. 엄마 아빠의 이혼 재판정에 함께 따라온 어린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젊은 판사 옆에 다가갔다. 그 아이는 마이크를 만지고, 판사를 툭툭 건드렸다.
판사는 아이를 나무라기는커녕 혹여나 놀랄까 봐 아이를 안아서 달래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뒤 재판을 진행했다. 아이를 맡기지 못한 채 재판에 올 수밖에 없던 부부의 사정을 고려해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한 것이다.
잊지 못할 장면은 또 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한 젊은 피고인이 무고를 당해 재판까지 갔다가, 결국 혐의에서 벗어났다. 아버지뻘 되는 재판장은 선고 직후 “(술) 한잔하고 싶으니 꼭 연락하라”는 메모지를 건넸다. 언제든 연락하라는 위로에 피고인은 힘든 시간을 보상받은 기분이었다고 한다.
몇 년 전 자살 방조 미수사건의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41호)이 화제가 된 적 있었다. 당시 재판부(재판장 박주영)는 생에 미련이 없는 피고인에게 처벌을 떠나 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짚어줬다.
30페이지에 걸친 판결문에는 자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 피고인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판결문 마지막에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라고 끝맺음한다. 재판부가 삶과 희망의 의지를 다지도록 격려한 셈이다.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을 찾아갈 차비를 하라며 20만 원을 건넸다. 그리고는 “밥 든든하게 먹고, 어린 조카 선물도 사라”고 위로했다고 한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한다. 하위법관은 선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판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법관 평가에서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어느 판사는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 XX들 하여튼…’, ‘딱 봐도 짜고 치는 거 아녜요?’, ‘넥타이를 똑바로 매고 와서 재판해야지’ 등 부적절한 언행도 지적된 바 있다.
우수법관으로는 사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사건 지연을 방지하고, 사건 당사자 등에게 친절히 절차를 전달해 당사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판사들이 선정된다. 단순히 선처하거나 내 편 들어준다고 좋은 판사는 아닌 것이다.
이보라 변호사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한 판사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재판장 자리에 ‘짜증 금지’ 메모를 붙여 놓았다고 한다”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더라도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판사의 판단에 따라 사람의 인생도, 가치관도 변할 수 있다”며 “존중과 이해를 베풀려고 노력하는 판사의 마음에 누군가가 또 다른 희망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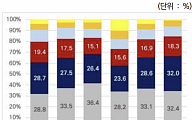

![[컬처콕 플러스] 아일릿, 논란 딛고 다시 직진할 수 있을까?](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5915.jpg)